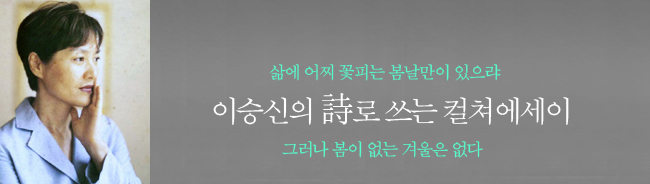
7년 전 쓰려 했던 틀에 이제사 추모하며 씁니다 2014 2 23
2021 12 28 과일 할머니 정든 할머니가 갔다. 과일 할머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백화점 속 식료품 코너와 현대식 수퍼마켓이 생기고는 남대문 동대문 등 몇 군데를 빼고 재래시장이 사라져 갔다. 경복궁 서편 서촌에도 두 개 시장이 있었는데 사랑스럽던 금천교 시장은 몇 해 전 술집 골목이 되어버렸고 통인시장 만이 남게 된다. 시내 한복판에 남아있는 것도 신기하다. 시장이란 볼거리가 많고 신선하여 언제 가도 재미있는 곳이다. '서민들의 미술관'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지방이나 해외를 가도 시장을 가면 얼마나 재미있나. 허나 서울에 제대로 된 수퍼가 없던 시절, 미국에 가 장보러 들어 간 수퍼는 규모가 어마하여 몇 가지 필요한 걸 그 속을 헤매다 샀고, 캐쉬 레지스터에 서서 계산만 하면 끝, 그 안에 정감이 생길 거리는 없었다.
고향에 돌아오니 Old Village에 커다란 수퍼미켓은 없으나 걸어 100여 미터 통인 시장이 그대로 있어 고마웠다. 재래 시장 특유의 생기 생동감, 가게마다 몇 마디 정감있는 말이 오가고 옛 것이 그런대로 남아 있어 그리워 하던 감성을 채울 수도 있었다. 몇 번 이미 썼지만 통인시장은 청와대와 가까워 명절 같은 때 민심을 알아본다고 대통령이 불쑥 나타나기도 하고 외빈이 오기도 하는데, 언젠가는 미 국무장관 John Kelly가 청와대 회담서 나오며 재래시장을 일부러 들렸고, 내가 마침 그 시각에 거기 있어 함께 떡볶기를 들며 다니던 워싱톤 대학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 그 후 그 기름 떡볶기는 더 유명해졌고 코로나 직전까진 외국 관광객이 꽤 온 곳이기도 하다.
내가 잘 가는 과일 가게가 그 초입에 있다. 과일 집이 많지만 위치가 편해서다. 이것저것 집어, 들고 걸으려면 조금만 사도 무거웠다. 그러나 집에 와 그걸 풀면 언제나 흐믓해진다.
하루는 고루 집으니 정말 무거웠다. 그래서 '아 이거 배달 좀 해줘야겠어요, 몇 번지로~' 하니 할머니와 그 옆 채소 가게 아줌마 할머니 몇몇이 우루루 나오더니 '아니 그 집요? 변호사 사모님 왜 몇 해 안보여요?' 하는 게 아닌가. '아 어머니 3년 전 가셨어요' 하니 과일 할머니가 놀라며 '오마나~ 40년 단골에 그런 분이 없는데~ 지나다 '오늘 어땠어요?' 물어 '한가했어요' 하면 그냥 가려다가도 발길 돌려 몇 가질 집고는 예를 들어 36,000원요~ 하면 남들은 다 깎는데 항상 더 얹어주었어. 세상에 그런 분 없어' 하는 게 아닌가. 그땐 우리 형제가 다 미국 유학이어 과일 많이 먹을 사람도 없었다.
어머니 가시자 그제사 철이 좀 든 나는 어머니 책들을 번역하여 만들어내고 세계로 행사와 강연을 하며 그 사랑과 평화의 정신을 알리는데 골몰했다. 마침 며칠 후 11월 22일은 어머니 기일이어 많은 사람을 '시인의 집'으로 초청해 어머니 시를 테마로 한 문학 음악 미술 영상 요리 등 멀티아트 행사를 매해 하는 날이었다. 할머니에게 '행사를 하는데 청중에게 그 말 좀 해주면 좋겠네~' 하니 '아 하지, 하고 말고' 한다.
말이 그렇지, 인사말 할 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나는 할머니가 한 그 말에 감동을 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다음 내가 간다면 일상에서 늘 보던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나는 과연 들을 수 있을까 하고.
그 후 거의 매일 일부러 그 시장을 걸어가 어머니 추억 하나라도 더 있나 물어보고 끝에 보행기 밀고 오신 이야기, 자기 사정을 묻던 이야기 등 흔적 한 개라도 들으면 위로가 되었다.
한 번은 한 달여 안보이기에 궁금했더니 작은 난로 곁에서 밤을 까다 종아리를 데어 한 달 넘게 수술로 입원을 했고, 돕던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내가 못 본 또 하나의 아들도 가는 일이 생겼다. 좌판 뒤 공간을 들여다 보니 컴컴해 잘 안보였지만 냄비에 끓여 끼니하는 게 보여 시장 갈 때마다 그대로 들 수 있는 찐 만두와 떡 김밥을 사 넣어줬다. 두부 계란 우유 생선도 보면 쥐어 주었다. 극구 사양했지만 내 엄마에게 더는 못 드리는 게 아쉽기만 해서 일 것이다. 잘 챙겨 드시고 시장 안에서라도 저리로 이리로 자꾸자꾸 걸으라고 잔소리도 했다. 오랜만에 가게 되면 '안 보여 걱정했다' 고도 해주었다.
몇 상인들과도 알고 지내지만 정든 그 할머니가 가신 것이다. 옆집 채소 할머니 말이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나왔던 건 아들 먼저 보낸 거 때문이라고 했다. 시장 속에도 사연은 있었다.
지난 해 올 해 가까운 몇 분을 잃었다. 거기에 이름도 모르나 과일과 함께 몇 마디 일상에서 주고 받던 그 할머니가 가신 것도 많이 허전하다. 막막한 한 해의 끝, 수 십 년 보아오던 과일 집이 닫혀진 것도 쓸쓸하고 인생이 만두 몇 번 들다 가는 거로구나 하는 생각도 드나, 그리도 그리던 아들을 하늘에서 마침내 만나고 혹여 내 엄마를 보게 된다면 이 딸과의 20 년 이야기도 했을 지 모른다는 생각에 좋은 마음으로 돌려 본다. 시장을 들어서면 첫 집에서 반겨주던 그 얼굴이 떠오를 것이다.
한없는 그리움인 엄마와 교감하고 나와도 정든 할머닐 하늘로 보내며
얼어붙은 연말의 시장을 나오다 
통인시장 초입 1호 과일 할머니 - 2014 2 25

| 
